너를 탐내도 될까? (59회) 몸값.
<대표 님.>
멈칫,
회의실에서 나온 기혁이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없다.
또 환청이다.
며칠 째 이런 증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왜 그런지 잘 알고 있으면서 애써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갔다.
<대표 님.>
머릿속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는 또 한 번 울려 퍼졌다.
이 목소리…
하나도 부드러운 맛이 없는 이 앙칼진 목소리.
그 여자 목소리다.
왜 한 번도 없던 환청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이리도 저 자신을 괴롭히는지 고통스럽기만 했다.
은서인 척 찐한 화장을 하고 회사에 나타났던 윤하정,
정확히는 그 뒤로 생겨난 증상이었다.
아픈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금방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보고 싶어서 왔어요.>
<대표 님.>
<대표 님?>
"그만해... 제발..."
괴로움에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린 기혁이가 혼자 중얼거렸다. 기혁의 그 짙은 속눈썹이 옅게 떨리면서 거부하는 말이 들리기라도 하 듯, 거짓말처럼 더 이상 하정의 목소리가 안 들렸다.
후- 하고 한숨을 내쉬며 기혁은 다시 눈을 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저벅저벅,
비서들의 인사를 받으며 기혁은 집무실에 들어갔다.
큰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며 멍을 때렸다.
윤하정...
당신은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하는 그 자체에도 당신은 또 열받아하겠지.
나한테는 항상 화가 잔뜩 쌓여있던 당신,
언제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도 잘 몰랐고,
또 그걸 알아도 어떻게 풀어줄지도, 정확히 풀어줄 수도 없던 나라서 당신은 또 더 많이 힘들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다.
크루즈선에서 마주친 게 당신이 아닌 진짜 은서였다면...
난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테지...
당신을 은서라 생각했던 내 실수였고 내 잘못이었다.
은서였다면...
룸에 들어온 나를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다른 객실로 보냈겠지.
나의 정신이 온전했다면,
그날 진짜 은서였다면 절대 저한테 먼저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란 걸 진작에 깨달았을 거였다.
내 실수로 윤하정 당신을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고 난 은서나 당신한테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다는 걸 자각했다.
은서한테도 나는 정말 몹쓸 인간이었다.
난 은서가 버스터미널에서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돌아가길 바랐다. 발랄하고 맑던 그 모습으로.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손아귀에 있을 줄 알았던 은서는 점점 더 멀리 도망을 쳤고 변해가고 있었다.
내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만큼 은서는 홀로 우뚝 서있었다.
내 마음이 그녀에게서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걸 자각을 못 한 채 은서만이 내 사랑이라고 주입시키면서 살아왔던 거다.
처음에는 확실히 은서와 똑같이 생긴 당신에게 고등학생이었던 은서의 모습을 찾고 싶어서 자꾸 만날 이유를 찾은 건 맞다.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단순 호기심이었던 마음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된 건 대체 언제부터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 거 같다.
윤하정이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은서한테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지만....
난 은서 네 동생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졌다.
기혁의 내내 차가웠던 눈동자가 붉어졌다.
"지이이이잉."
사색을 멈춘 건 손에 그러쥐었던 폰의 진동 소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발신자를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였고 기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후엔 지방에 있는 공장을 돌아볼 참이라 이런 사사로운 생각은 그만 집어넣고 챙겨봐야 할 서류가 생각나 책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차였다.
"지이이이잉."
또 한 번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다.
책상 위에 올려다 놓으며 의자에 앉으려던 기혁의 두 눈이 차츰 커져갔다.
발신자는 <윤하정>이었다.
이한에게서 윤하정의 번호를 받은 지는 한참이나 되었지만 차마 전화를 할 수가 없었던 그녀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다.
왜...
폰을 잡으려던 손이 멈칫 멈추었다.
왜 전화를 한 거지?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니 한없이 가라앉고 고요했던 가슴이 요동치기 바빴다.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또 기대를 하게 되었다.
머뭇거리는 사이 진동 소리가 멈추었다.
폰을 잡은 기혁이가 아쉬움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일 때 또 한 번 하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바로 받았다.
어떤 목소리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여보세요."
휴대폰 너머는 조용했다.
"여보세..."
"어?? 받았네! 와아. 그래도 이 번호로 전화를 하니 받네?"
고양이처럼 도도하고 매력적인 하정의 고운 목소리가 아닌, 약간 걸걸한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전화기 너머로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기혁의 짙은 눈썹이 일순간 확 구겨졌다.
"당신, 누구야?"
"하아... 권기혁 대표님.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네?"
누구지?
어디선가 들어보았던 목소리는 틀림없는데 이 기분 나쁜 목소리를 대체 어디에서 들었던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휴대폰을 꽉 그러쥔 기혁이가 어금니를 깨물었다.
"하정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정의 전화를 웬 사내가 하고 있다? 그건 많이 이상했다.
"와아..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하네. 날 벌써 잊은 겁니까? 저를 그렇게 길바닥에 내치고서 이렇게 쉽게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섭섭하게 서리."
빈정대는 그 목소리는 기혁의 귓속을 기분 나쁘게 후비고 있었다.
누굴지 급하게 생각을 하던 기혁이 사고가 뚝 멈추었다.
설마...
"김재중 기자?"
"와오~ 빙! 고!"
쩌렁쩌렁 크고 신나 보이는 목소리가 기혁이에게 대단한 퀴즈를 맞힌 듯 신랄하게 웃어댔다.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 기혁은 스캔들 사진을 제멋대로 찍어대고 은서를 곧장 찾아가 소란을 피웠던 김재중을 다시는 기자 생활을 못 하도록 여러 군데 손을 봤었다.
은서를 건드린 대가였으니 그대로 찌그러져 살다가 사라지길 바랐다.
근데 지금... 지금 무슨 상황인 거지?
하정의 휴대폰으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다니...
그럼 하정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지?
두근대던 아까와는 달리 불안이라는 단어가 온몸을 휩싸면서 기혁이 가슴을 꽉 조여왔다.
"하정 씨를 어떻게 한 거야."
가라앉은 중저음이 한산하게 느껴졌다.
휴대폰 너머 김재중이 픽 하고 짧게 웃는 게 들려왔다.
"뭐... 잘 자고 있지. 깨면 통화라도 시켜주고 싶은데 손수건에 환각제를 너무 많이 묻혔나. 쉽게 못 깨네?"
하,
여지없이 기분 나쁘게 키득대며 납치라도 한 것 같은 김재중의 그 발언에 크나큰 주먹을 더 꽉 웅켜 쥔 기혁이가 온몸에 힘이 바짝 들어간 채 나지막이 이를 갈았다.
"털끝이라도 건드리기만 해 봐. 죽여버린다."
"하, 되게 무섭네. 아니, 그러면 내 밥줄을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버리질 말았어야지. 근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고? 강은서라고 했던가? 처음엔 그 업소 마담이 대표님께서 아끼는 여잔 줄 알고 납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강은서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윤하정이 룸살롱으로 들어가네? 히야...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김재중이 입꼬리를 한없이 올리고 저 때문에 바짝 긴장해 있을 기혁의 모습을 상상하며 혀를 더 놀렸다.
"그래 이상하긴 했어. 강은서는 그때 내가 대표님 본가 앞에서 봤던 그 차를 갖고 있는 거 같지 않았고 분위기가 뭐랄까. 그때 멀리서 보던 그 여자랑은 꽤 달랐거든. 우리 매력 넘치는 대표님께서 쌍둥이를 그렇게 갖고 놀 줄은 모른 채 나만 바보였던 거야. 돈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가능한가 싶으면서 부럽더라고. 권 대표 당신이."
비꼬는 말로 잘도 떠들어대는 김재중은 부럽다는 말은 진심이었다. 이제 이 정도면 권기혁의 속이 얼마나 뒤틀렸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웠다.
그러나 상상과는 달리 기혁의 말투는 한없이 차분했다.
"허튼 소리 집어치우고 이딴 짓을 벌여서 뭐 할 건데? 당신은 어차피 얼마 못 가서 바로 잡힐 거고 인생 쫑 날 건데. 남은 인생을 감방에서 보낼 생각인가 보지?"
기혁이 말을 들은 김재중이 입꼬리를 내렸다가 다시 비스듬히 올렸다.
"뭐, 권 대표가 아끼는 여자를 나락으로 보내고 감방 가는 거라면 그것도 괜찮지."
이제 더 잃을 게 없어 보이는 그한테서 진심일 수도 있는 말이 흘러나왔다.
"개 자식."
입술을 짓이긴 기혁이 입에서 나지막한 욕이 나왔다.
"그래. 바로 이 반응이지."
김재중이 연신 껄껄 웃어 댔다. 이제야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아 기분이 꽤 날아갈 것만 같았다.
"원하는 게 뭔데."
이쯤 되니 하정을 납치한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기혁은 간단하게 파악했다.
"오오, 역시 권 대표."
애가 타는 건 본인이 아니라는 거에 느긋한 김재중이 천천히 입을 움직였다. 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걸 말해야 할 타이밍이었다.
"100억."
돈 액수만 말하고 한 템포 멈추었다.
"권 대표한테는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싶으면서도 이제 백수인 내가 이 정도에 만족을 해보려고.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탈 나니까."
낄낄 웃어대는 김재중의 기분 더러운 음성에 기혁이 귓속이 째질 듯 아팠다.
"준비할게. 단, 하정 씨 상태를 확인해야겠어."
"역시 사업가네. 바로 딜이 들어가고."
김재중이 콧방귀를 뀌었다.
"사진은 찍어줄 건데, 100억을 어떻게 받을지는 내가 아주 천천히 생각을 더 해보고 다시 연락할게."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 종료가 되었다.
얼빠진 기혁이가 몇 초 자리에 굳었다가 급하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있다는 안내음만 반복으로 나왔지만 기혁은 연신 통화 버튼을 눌러 댔다. 떨리는 두 손에 힘이 안 들어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구어 무릎을 접고 그것을 주워들었다.
또 윤하정의 폰에 전화를 걸었다.
".... 대표님?"
몇 번을 한 노크에 기혁의 반응이 없자 금방 대표 실로 발을 들인 이한이가 바닥에 무릎을 내리고 있는 기혁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넋이 나간 기혁을 살폈다.
어딘가에 그리 급하게 전화를 거는지 자신이 옆에 왔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실장."
그렇게 정신이 없어 보이던 기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이한을 마주했다.
"네. 대표님."
"당장 강문철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넣어. 여기에 들어온 이 번호와 하정 씨 번호로 위치 추적해 보고."
"네? 왜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이한은 두 눈만 껌뻑이었다.
"김재중 그 새끼가 하정 씨를 납치하고 돈을 요구했어."
"네???"
반반하던 얼굴이 마구 구겨진 기혁을 마주한 이한의 두 눈이 한없이 커져 갔다. 어버버 해서 입만 뻐금 거리다가 이럴 때가 아니란 생각에 바로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그새 기혁은 옷걸이에 걸려있던 재킷을 집어 들고 집무실을 급히 빠져나갔다.
 基于语义框架的汉韩动词对比及教学创新模式研究--중한 나눔 동사
基于语义框架的汉韩动词对比及教学创新模式研究--중한 나눔 동사 성인병 예방과 장수하는 건강법--生命回归自然(朝鲜文)
성인병 예방과 장수하는 건강법--生命回归自然(朝鲜文) 动物王国-동물왕국
动物王国-동물왕국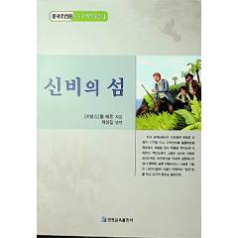 신비의 섬--神秘岛(朝鲜文)
신비의 섬--神秘岛(朝鲜文)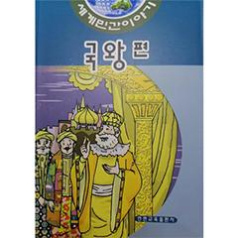 세계민간이야기 국왕편--世界民间故事.国王篇입점신청
세계민간이야기 국왕편--世界民间故事.国王篇입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