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
강낭떡에 얽힌 사연
이 근년에 와서 우리 집은 물론이려니와 이웃에서들도 가낭떡을 쪄먹는것을 보지를 못하였다. 고마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념불외우듯 외워도 실지로 배가 고프거나 또는 강낭덕따위에 목을 매고 살아야 한다면 그런 공념불은 아무리 외워도 다 소용이 없는 법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그 강낭떡을 무조건적으로 타박만 할수는 없는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강낭떡이 생각밖에 은을 내기도 하기때문이다.
내가 강낭떡과 영광스러운 첫대면을 한것은 항일전쟁시기 태항산항일근거지에서였다. 난생처음 강낭떡이란것을 멋도 모르고 한입 덥석 베물고 나는 곧 속으로 울부짖지 않을수 없었다.
(아이구, 내 일생은 인젠 끝장이다! 이런걸 먹구 사람이 어떻게 산단 말이!)
그러나 나의 이러한 비관주의는 오래지 않아 곧 시정이 되였다. 시정이라느니보다는 극복 또는 압도가 되였다. -끼니마다 통 강냉이를 삶아먹게 되였기때문이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전비를 톡톡히 뉘우쳤다.
(복에 겨워서 복을 몰랐었구나!)
지나간 한때 인위적인 재해로 우리들의 가정에 강낭떡이 등장을 하였을 때, 나는 가슴이 아파서 차마 보기 어려운 광경을 목도하였었다. 끼니마다 강낭떡을 들이대니까 철 없는 어린아이들이 먹기 싫다고 밥투정을 하는데 엄마가 얼림수로 강낭떡을 가장 맛나는체 떼먹어보이며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요렇게 맛있다는걸 안 먹어? 어서 먹어라! 자 어서!>>
이와 같이 아이들을 달래니 어린것들이
<<엄마는 제가 좋아하니까 우리한테두 밤낮 강낭떡만 쪄준단 말이야!>>
하고 그 엄마를 칭원하는것을 보았던것이다. 가엾은 엄마!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먹이고싶은 쌀밥을 먹일수 없는 엄마의 안타까운 심정. -정직한 인간으로서는 차마 눈뜨고 보기가 어려운 광경이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희생적정신이 강한 우리의 녀성들은 이런 시달림속에서 눈물을 속으로 흘리며 그 몇해를 살아나와야 하였었다.
내가 강낭떡을 크림빵보다도 증편보다도 카스텔라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된것은 그 유명짜한 무법천지통에 추리구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이다. 강낭떡을 아침에는 석냥짜리 하나를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는 각각 넉냥짜리 하나씩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부식물이라는건 멀건 남새국 한사발뿐이니까 량에 차지를 않아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허구한 날 배가 차지 않는다는것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경지다.
배를 한번 잔뜩 불리워보고싶은 욕망이란 강렬하기가 짝이 없는것이여서 그 무엇이라도 막아낼수는 없었다. 그리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죄수들은 궁여지책으로 한끼씩을 엇갈아 굶는 방법을 썼다. 즉 한끼를 먼저 굶고 강낭떡을 남에게 뀌여주었다가 나중에 받아서 한꺼번에 두개를 먹거나 아니면 먼저 두개를 먹고 나중에 한끼를 굶는것이다.
미결감방에서는 먼저 먹는 놈이 다음 때식때가 되기전에 갑자기 이감(移监)이 되거나 석방이 되여서 뀌여준 놈이 크게 랑패를 보는수가 있지마는 기결수들사이에는 그런 돌발사건이 있을수 없으므로 그 점만은 모두 안심들 하였다. 그렇지만 한끼를 굶고 네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다음 끼니때를 기다린다는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허기증이 나서 나가 너부러지는 놈까지 다 있었다. 더운물에서 건져서 찬물에 담그거나 찬물에서 건져서 더운물에 담그는 식으로 배를 불려보았다 곯려보았다 하는것이 좋을리가 없었다.
이밖에도 또 여러가지 방법을 시험들 해보았으나 그 결과는 다 신통치가 못하였다. 워낙 절대량이 부족하기때문이였다.
한번은 이른바 모범죄수들만 한 30명 골라뽑아 데리고 돈화거리로 공장견학을 갔었다. 당일치기니까 점심 한끼만 밖에서 먹으면 되였다. 겉치레 잘하는 감옥당국에서는 바깥세상사람들이 보는데서 죄수들에게 식은 강낭떡을 먹이는것은 볼품이 사납다고 떠나기전에 미리 빵을 사다가 매 사람 두개씩 노나주었다. 그리고 명백히 잘라말하였다.
<<점심시간에는 더운물만 공급할테니까 다들 그런줄 알라.>>
오전의 견학을 마치고 한낮때가 되자 간수들은 죄수견학단을 끌고 미리 교섭해놓은 국영식당에를 들어왔다. 한쪽구석에 한 30명 앉을 자리가 마련되여있었다. 다른 손님들이 구경스레 바라보는 가운데 죄수들이 자리잡아앉자 곧 접대원들이 더운물 2통과 빈 사발 서르나문개를 갖다주었다. 죄수들이 제각기 사발에다 다운물을 떠가지고 상에 죽 둘러앉아 훌훌 마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빵을 꺼내먹는 놈은 하나도 없었다. 괴이쩍게 여긴 간수들이 구경하는 다른 손님들을 흘금흘금 곁눈질해보면서 입속말로-도적놈 개 꾸짖듯-죄수들을 독촉하였다.
<<무엇들 하구있어? 어서어서 빵을 꺼내먹지 않구!>>
그러나 죄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맹물만 마시고있었다.
<<어떻게 된거야! 왜들 말이 없어?>>
화증난 간수가 어깨를 잡아흔드는 바람에 할수없이 한놈이 대답을 올렸다.
<<저 아침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간수들은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서로 돌아보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단 한놈의 례외도 없이 아침의 강낭떡 하나와 점심의 빵 두개를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모두들 빈손 털고 떠나왔던것이다. 그러니까 속내 모르는 구경군들이야 감옥에서는 죄수들에게 점심을 먹이지 않고 맹물한 먹이는줄로 알 밖에!
(정치적영향이 얼마나 나쁜가!)
<<죽일 놈들, 얼마나 나쁜가!)
중인소시에 피대도 세울수 없는 간수들은 모주 먹은 돼지 벼르듯 죄수들을 벼르기만 하였다.
그 10년 동안의 무법천지통에 밖에 있는 사람도 갖은 곡경을 다 치렀는데 감옥안에 갇힌 사람이야 더 말할게 있을건가!
감옥에서도 한달에 두끼씩은 쌀밥을 먹이는데 나는 매번 다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묵은 강낭떡과 맞바꾸어먹었다. 쌀을 일지 않고 밥을 짓기때문에 돌이 너무 많아서 먹을수가 없어서였다(이발이 견뎌내지 못하였다). 밑바닥에서 푼 밥은-돌이 밑으로 가라앉기때문에-더 형편이 없었다. 혼강시에서 이감되여온 정치범 하나가 성질이 워낙 깐깐한 까닭에 한사발 밥에 돌이 대체 몇개나 들어있나 세여본즉... 무려 127개! 그는 당장 감옥당국에 이 <<놀라운>> 실정을 서면으로서 보고하였다-<<이런 밥을 우리더러 어떻게 먹으랍니까!>>
그러나 감옥당국에서는 그의 보고를 무시해버렸다. 모르기는 해도 아마 천명 사람이 먹는 밥의 쌀을 인다는 재간이 없어서였을것이다. 그 바람에 그에게는 공연히 별명만 하나 생겼다.-<<이얼치(127)>>. 그때부터 동료죄수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보 이얼치, 그 삽 이리 좀 집어주우.>>
<<가루비누 남은게 좀 없소 이얼치?>>
이렇게들 부르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감옥안에서도 감동적인 장면은 없지 않았다. 설 같은 때 먹을것이 푸짐하게 공급되면 그것을 먹지 않고-다른 중대에 있는 동생을 갖다주겠다고-싸들고 달려가거나 달려오는 죄수들이 있었다. 형제간에 또는 부자간에 같은 사건으로 들어오는 일이 더러 있었기때문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옥당국에서는 그후부터 혈족을 한감옥에는 가두지 않기로 하였다.
나는 감옥안에서 배고픈 세월을 보내면서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고 쓴웃음을 웃지 않을수 없었다.
30년대 중앙륙군군관학교에서의 일이다. 3개 대대 천여명 학생이 먼 행군길을 떠나게 되였다. 각 중대에서는 출발직전에 매인당 군량미 한 전대씩을 노나주었다. 총에 칼에 탄약에 수류탄에 외투에 탄자에... 짐이 이만저만 무겁지가 않은데 거기다 또 쌀전대까지 얹으라니 죽을 지경인것은 사실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갖고 길을 떠나겠는가! 내가 전대를 배낭에 얹혀놓고 어떡허다 보니 교정끝에 있는 변소뒤로 숱한 학생들이 들락날락하고있었다.
(대체 무얼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슬렁슬렁 가보니 아 이런! 변소뒤에 하얀 입쌀이 피라미드형으로 쌓였는데 숱한 녀석들이 거기다 제 각기 전대의 쌀을 덜고있지 않는가! 한놈이 한두근씩만 덜어도 사람의 수효가 워낙 많으니까 피라미드가 될 밖에 없었다.
일생을 살아가자면 남아서 주체궂어하는 때도 있고 또 모자라서 허덕거리는 때도 있는것이 아마 인생인 모양이였다.
만기출옥을 한 뒤에 감옥안에서 그렇게도 먹고싶던 강낭떡을 한번 좀 실컷 먹어보려고 안해더러 강낭떡을 쪄오랬더니-하나도 맛이 없었다. 차일시피일시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싶었다.
강청이 일파와 더불어 강낭떡시대는 인제 영영 가버렸다. 지긋지긋한 강낭떡시대는 영원히 가버렸다.
 中国朝鲜族艺术文论集.视觉广播影像篇--예술연구문집.시각방송영
中国朝鲜族艺术文论集.视觉广播影像篇--예술연구문집.시각방송영 湖光山色--맑은 호수,푸른 산
湖光山色--맑은 호수,푸른 산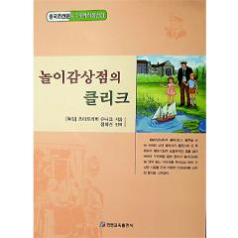 놀이감상점의 클리크--玩具店的克利克(朝鲜文)
놀이감상점의 클리크--玩具店的克利克(朝鲜文) 물의 아이--水孩子
물의 아이--水孩子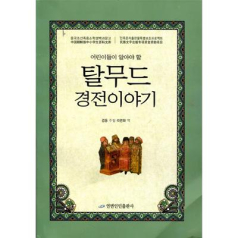 탈무드 경전이야기--塔木德经典입점신청
탈무드 경전이야기--塔木德经典입점신청
